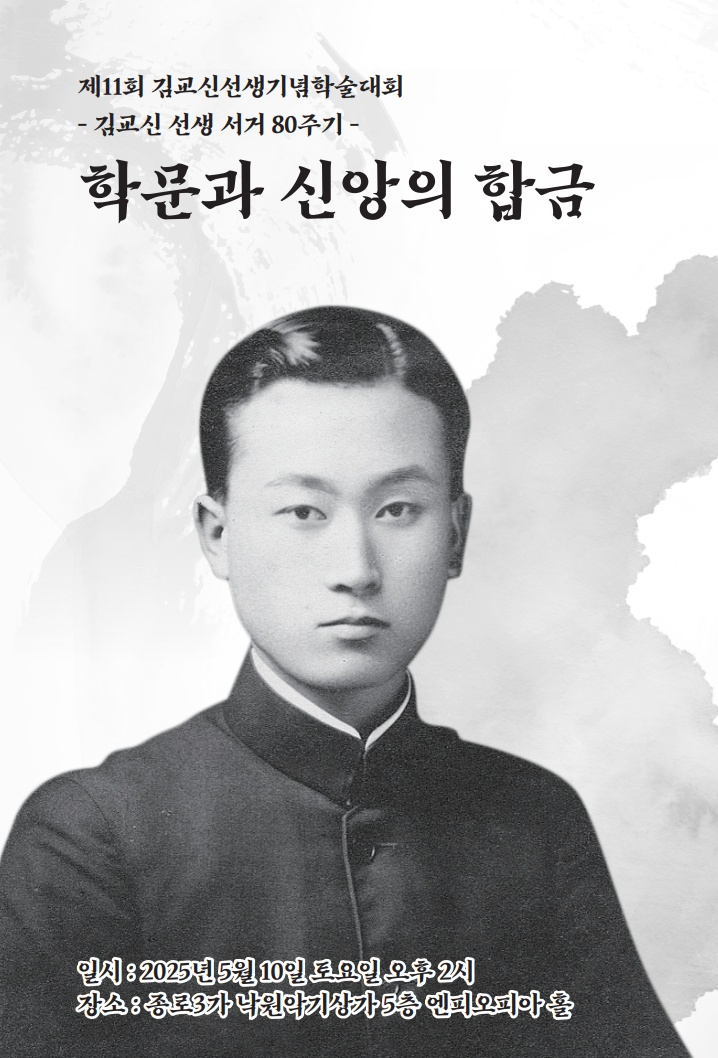
<무교회 그룹의 독서 전통>
.
독서가인 우치무라는 칼라일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1891년 1월의 ‘우치무라 간조 불경사건’에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칼라일의 《크롬웰 전기》였다.
우치무라는 이 책을 통해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절감했고, “칼라일과 크롬웰에게 마음을 빼앗겨 도저히 양심에 걸려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
한 권의 책이 우치무라의 인생을 바꾼 셈이다.
‘불경사건’은 천황의 신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우치무라 개인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사의 관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우치무라는 칼라일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밝혔다.
.
무교회 그룹은 각별한 독서 전통 또는 지적 계보를 갖고 있다.
물론 그 기원은 무교회주의를 출발시킨 우치무라 간조다.
무교회 그룹은 전통적으로 단테, 밀턴 등 서양의 기독교 고전을 적극 권장했다.
예를 들면, 우치무라는 삿포로농학교 시절 영국인 교수 제임스 서머James Summers의 가르침으로 밀턴을 배웠다.
일본 사상사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밀턴에 접근한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한편 우치무라의 제자인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도쿄제국대학에서 해직·추방된 후 고전 독서회 ‘토요학교’를 열어 밀턴의 《실낙원》, 단테의 《신곡》 등을 강의했다.
우치무라와 야나이하라는 일본 사회에 밀턴을 최초로 소개한 지식인으로 분류된. (Milton Encyclopedia, s. v. “Japan, Milton's Influence in,” by Jun Harada.)
.
젊은 날의 노평구가 김교신을 처음 만나던 날, 김교신은 “우치무라 선생 문하의 쓰카모토 선생은 취미로 하는 단테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부러운 듯이 말했다고 했다.
.
서양 기독교 고전에 대한 독서 전통이 우치무라에서 시작하여 제자들에게 계승·확산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교신과 무교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교회 그룹의 독서 전통에 익숙해져야 한다.
국내 연구자들의 김교신 연구에서 종종 보이는 오해와 왜곡은 이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
우치무라의 독서 편력은 단테(14세기), 밀턴(17세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특히 ‘19세기적 교양’에 주목했고, 19세기 서양의 작가, 문인, 시인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우치무라가 1898년 1월 도쿄 기독교청년회관에서 5회에 걸쳐 행한 문학강연을 책으로 펴낸 《종교와 문학》(1899)은 우치무라의 독서 편력과 취향을 잘 보여준다.
칼라일, 단테, 괴테, 워즈워스, 테니슨, 브라이언트, 로웰, 휘트먼 등 주로 동시대 영미 문인과 작가들을 소개한 이 책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칼라일이다.
.
《종교와 문학》이 다룬 문인 중 밀턴과 단테를 제외하면 대부분 19세기 문인들이다.
우치무라에 의해 발견된 ‘19세기적 교양’과 독서는 무교회 그룹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우치무라의 독서목록에서 칼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물론 김교신과 함석헌도 그 영향권 아래 있었다.
.
사회학자인 세이무어 마틴 립셋은 ‘단지 하나의 나라만 알고 있는 연구자는 하나의 나라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 과정이 없으면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 방식이 그 사회 특유의 것인지 보통의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오직 비교 분석을 거쳐야만 지리, 기후, 기술, 종교, 갈등 등의 요인이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김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교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한국사’, ‘한국기독교’의 협소한 시야로는 충분치 못하다.
‘동아시아사’로 넓혀봐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양의 2천년 기독교 전통에까지 시야를 확대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기독교 전통에서 어떤 사상가, 어떤 고전의 영향을 받았는지 입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서 무교회주의적인 요소들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01.블로거활동 (2010~2025) > 2.역량강화 (전공학회.인문학강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시대의 청년은 "왜" 우파가 되었는가?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6시) (0) | 2025.05.08 |
|---|---|
| [제108차 통일학포럼]<북일관계(朝日関係)와 북한의 관광정책 - 이소자끼 아츠히또 게이오대학교 교수> 5월 12일(월) 15:00 (0) | 2025.05.08 |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창립 10주년 학술회의 개최(5.16-17) (0) | 2025.05.08 |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창립 10주년 학술회의 개최(5.16-17) (0) | 2025.05.01 |
| 강원대학교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제8기 수강생 모집(5.7.수까지) 안내 (0) |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