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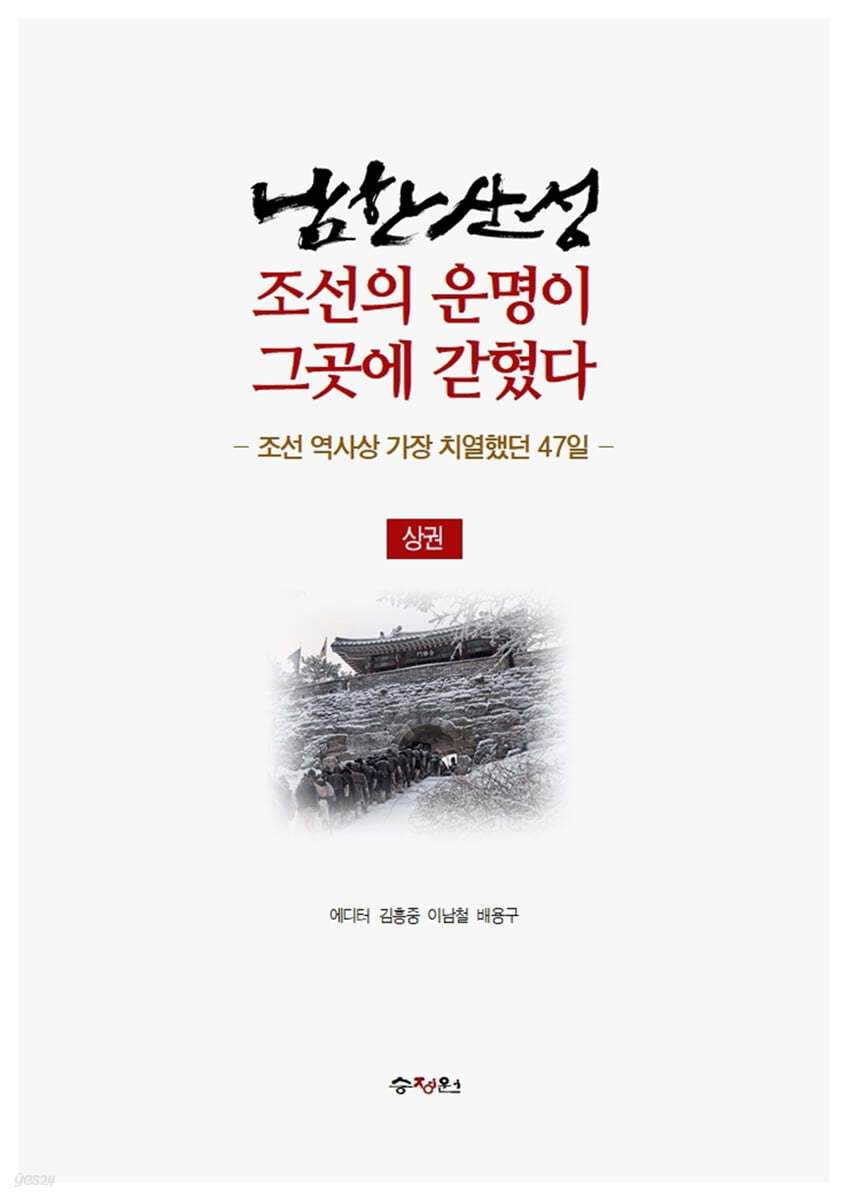
목차
서문 / 3
남한산성으로 몽진 / 9
경들이여, 경들이여 / 20
망월대 / 51
산성이 포위된 지 7일째 / 91
익지 않은 술 / 93
청에 속은 화친 / 139
허수아비와 횃불 / 158
붉은 깃발 / 171
삶은 소고기 / 184
연주봉 전투 / 196
망궐례 / 212
비보다 눈 / 218
거적자리와 임금의 통곡 / 220
겨울비에 흠뻑 젖은 임금 / 244
고립 10일째 / 246
빈 가마니 / 253
운제 / 267
망극할 지경 / 278
소와 술 / 306
주요 등장 인물 / 337
남한산성으로 몽진 / 9
경들이여, 경들이여 / 20
망월대 / 51
산성이 포위된 지 7일째 / 91
익지 않은 술 / 93
청에 속은 화친 / 139
허수아비와 횃불 / 158
붉은 깃발 / 171
삶은 소고기 / 184
연주봉 전투 / 196
망궐례 / 212
비보다 눈 / 218
거적자리와 임금의 통곡 / 220
겨울비에 흠뻑 젖은 임금 / 244
고립 10일째 / 246
빈 가마니 / 253
운제 / 267
망극할 지경 / 278
소와 술 / 306
주요 등장 인물 / 337
출판사 리뷰
“조선 역사상 최악의 참패, 병자호란,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47일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바로 병자호란이다.
국운을 건 선택에 내몰린 조선은 청나라가 정묘년에 맺었던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고 조선에 신하의 예를 갖출 것과 세폐 규모도 크게 늘렸다. 이에 화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최명길 등의 주화론과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해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김상헌 등의 주전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1636년 2월, 용골대와 마부대가 인열왕후의 국상에 사신으로 왔다가 인조가 국서를 받길 거부하고, 또 주전론자들이 두 사신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황급히 조선을 떠났다. 청나라는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에게 “왕자와 주전론 주창자들을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다시 군대를 일으키겠다.”라고 위협했지만 주전론 쪽으로 기울던 조선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12월 1일, 청 태종은 청군 7만 명, 몽골인 3만 명, 한족 2만 명 등 모두 12만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공하였다. 청나라 군대가 12일에 압록강을 넘은 뒤, 13일에는 평양, 14일에는 개성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에 도성의 주민들 사이에는 혼란이 일어났고, 피란 행렬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이에 세자빈 강씨와 원손, 둘째 봉림대군, 셋째 인평대군을 14일 강화도로 피란 보냈다. 인조도 이날 밤 강화도로 향하려 했으나, 청군이 이미 연서역을 통과했고, 강화도로 가는 길까지 차단했다는 보고를 받고 강화도행을 포기하고 소현세자와 함께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길에 나섰다. 한성 주변 관리들이 수백 명씩 군사를 몰고 집결해 산성 내 병력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인조는 도성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적군이 이미 양철평까지 왔다는 급보를 받자 최명길을 청군에게 보내 강화를 청하면서 시간을 끌게 했다.
12월 15일 새벽, 인조는 강화도로 옮기기 위해 남한산성을 나섰으나,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산길이 얼어서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걷다가 여의치 않아 결국 남한산성으로 되돌아갔다. 또 강화도로 향한 세자빈 강씨 일행은 갑곶나루에 이르렀으나, 나룻배가 없어 이틀을 추위에 떨다가 겨우 강화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백성은 미처 나룻배를 타지 못해 청군에게 희생당했고 조정과 일반 백성까지 청군의 거센 진격에 제대로 손쓸 틈이 없었다.
조선군과 청군의 전면전은 피한 채 산발적인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군 300여 명이 청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성 바깥으로 나갔다가 몰살당한 일로 군사들의 사기는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다.
1637년 1월 들어 청 태종은 군사를 20만 명으로 늘려 남한산성 밑 탄천에 포진시키니 남한산성은 갈수록 고립무원의 지경이 되었다. 당초 산성 내에는 양곡 1만 4,300석과 장 220항아리 등 50일간의 양곡이 준비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청 태종은 직접 서한을 보내 화친의 뜻을 내비치며,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와 군신의 예를 갖추고, 그에 앞서 척화신 두세 명을 먼저 내보라고 압박했지만 인조는 “차라리 척화한 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들을 내줄 수 없다.” 하며 거부했다. 이미 싸울 뜻을 잃은 일부 군사들은 척화신을 내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전론자인 윤집과 오달제는 스스로 적진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남한산성에 피신한 지 48일째인 1월 30일, 인조는 소현세자와 남색 옷을 입고 서문을 통해 산성에서 나가니, 청 태종은 한강 동편의 나루터인 삼전도에 9층으로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의 막과 양산에 병기와 깃발이 단을 에워싸고 있었고, 정병 수만 명이 단을 중심으로 네모지게 진을 치고 있었다. 청 태종은 장수들에게 활쏘기를 시키다가 멈추게 하고는 인조에게 100보가량을 걸어서 3정승과 6조 판서가 함께 뜰 안의 진흙 위에서 배례하게 했다.
신하들이 돗자리 깔기를 청했지만, 인조는 “황제 앞에서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리오.”라고 했다. 인조는 청 태종이 앉아 있는 단을 향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의 삼배구고두례를 행했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어 청 태종이 인조에게 돈피 갖옷 두 벌을 건네자, 인조는 그중 한 벌을 입고 다시 뜰에서 세 번을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청에 신하의 예를 갖출 것, 명과 단교할 것, 청에 물자와 군사를 지원할 것, 청에 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말 것, 세폐를 보낼 것 등이다. 조선과 청의 이런 관계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청이 패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청은 철군하면서 소현세자와 세자빈, 봉림대군 등을 볼모로 데려갔고 조선인 여자 50만 명도 함께 끌려갔다. 당시 심양 시장에서 팔린 조선인만 해도 66만여 명이나 됐다. 인조가 항복의 예를 마친 뒤 백관과 함께 도성으로 향할 때, 포로로 잡힌 남녀 조선인 1만여 명이 길옆에서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라며 울부짖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치욕의 시간이었다.
2024년 초여름 편집인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47일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바로 병자호란이다.
국운을 건 선택에 내몰린 조선은 청나라가 정묘년에 맺었던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고 조선에 신하의 예를 갖출 것과 세폐 규모도 크게 늘렸다. 이에 화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최명길 등의 주화론과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해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김상헌 등의 주전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1636년 2월, 용골대와 마부대가 인열왕후의 국상에 사신으로 왔다가 인조가 국서를 받길 거부하고, 또 주전론자들이 두 사신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황급히 조선을 떠났다. 청나라는 황제 대관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에게 “왕자와 주전론 주창자들을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다시 군대를 일으키겠다.”라고 위협했지만 주전론 쪽으로 기울던 조선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12월 1일, 청 태종은 청군 7만 명, 몽골인 3만 명, 한족 2만 명 등 모두 12만의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공하였다. 청나라 군대가 12일에 압록강을 넘은 뒤, 13일에는 평양, 14일에는 개성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에 도성의 주민들 사이에는 혼란이 일어났고, 피란 행렬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이에 세자빈 강씨와 원손, 둘째 봉림대군, 셋째 인평대군을 14일 강화도로 피란 보냈다. 인조도 이날 밤 강화도로 향하려 했으나, 청군이 이미 연서역을 통과했고, 강화도로 가는 길까지 차단했다는 보고를 받고 강화도행을 포기하고 소현세자와 함께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길에 나섰다. 한성 주변 관리들이 수백 명씩 군사를 몰고 집결해 산성 내 병력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인조는 도성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적군이 이미 양철평까지 왔다는 급보를 받자 최명길을 청군에게 보내 강화를 청하면서 시간을 끌게 했다.
12월 15일 새벽, 인조는 강화도로 옮기기 위해 남한산성을 나섰으나,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산길이 얼어서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걷다가 여의치 않아 결국 남한산성으로 되돌아갔다. 또 강화도로 향한 세자빈 강씨 일행은 갑곶나루에 이르렀으나, 나룻배가 없어 이틀을 추위에 떨다가 겨우 강화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백성은 미처 나룻배를 타지 못해 청군에게 희생당했고 조정과 일반 백성까지 청군의 거센 진격에 제대로 손쓸 틈이 없었다.
조선군과 청군의 전면전은 피한 채 산발적인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군 300여 명이 청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성 바깥으로 나갔다가 몰살당한 일로 군사들의 사기는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다.
1637년 1월 들어 청 태종은 군사를 20만 명으로 늘려 남한산성 밑 탄천에 포진시키니 남한산성은 갈수록 고립무원의 지경이 되었다. 당초 산성 내에는 양곡 1만 4,300석과 장 220항아리 등 50일간의 양곡이 준비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청 태종은 직접 서한을 보내 화친의 뜻을 내비치며,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와 군신의 예를 갖추고, 그에 앞서 척화신 두세 명을 먼저 내보라고 압박했지만 인조는 “차라리 척화한 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들을 내줄 수 없다.” 하며 거부했다. 이미 싸울 뜻을 잃은 일부 군사들은 척화신을 내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전론자인 윤집과 오달제는 스스로 적진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남한산성에 피신한 지 48일째인 1월 30일, 인조는 소현세자와 남색 옷을 입고 서문을 통해 산성에서 나가니, 청 태종은 한강 동편의 나루터인 삼전도에 9층으로 단을 만들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의 막과 양산에 병기와 깃발이 단을 에워싸고 있었고, 정병 수만 명이 단을 중심으로 네모지게 진을 치고 있었다. 청 태종은 장수들에게 활쏘기를 시키다가 멈추게 하고는 인조에게 100보가량을 걸어서 3정승과 6조 판서가 함께 뜰 안의 진흙 위에서 배례하게 했다.
신하들이 돗자리 깔기를 청했지만, 인조는 “황제 앞에서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리오.”라고 했다. 인조는 청 태종이 앉아 있는 단을 향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의 삼배구고두례를 행했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어 청 태종이 인조에게 돈피 갖옷 두 벌을 건네자, 인조는 그중 한 벌을 입고 다시 뜰에서 세 번을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청에 신하의 예를 갖출 것, 명과 단교할 것, 청에 물자와 군사를 지원할 것, 청에 적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말 것, 세폐를 보낼 것 등이다. 조선과 청의 이런 관계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청이 패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청은 철군하면서 소현세자와 세자빈, 봉림대군 등을 볼모로 데려갔고 조선인 여자 50만 명도 함께 끌려갔다. 당시 심양 시장에서 팔린 조선인만 해도 66만여 명이나 됐다. 인조가 항복의 예를 마친 뒤 백관과 함께 도성으로 향할 때, 포로로 잡힌 남녀 조선인 1만여 명이 길옆에서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라며 울부짖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치욕의 시간이었다.
2024년 초여름 편집인
남한산성, 조선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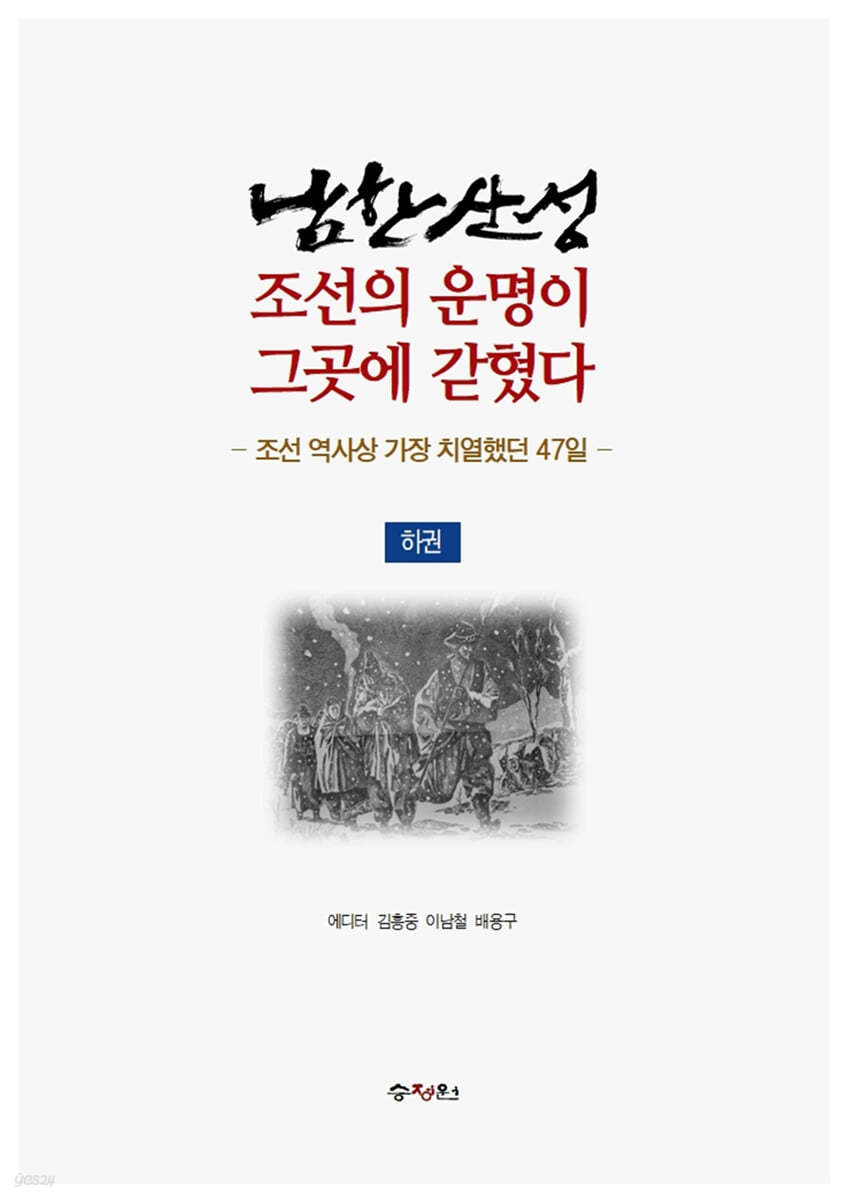
목차
무익한 죽음 / 365
말고기와 황두 / 374
화호의 치욕 / 392
원망 / 418
고립 20일째 / 445
벌을 주면 해가 없고, 벌을 주지 않으면 해가 있는지 / 460
작은 돌, 큰 돌 / 476
1월 한겨울의 짙은 안개 / 487
폐단 / 491
온조왕 / 494
암퇘지 / 496
말꼴과 참살 / 499
햇무리 / 502
도정 / 504
호종관 / 505
전사자의 염빈 / 507
구원병 소식 / 509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양 / 511
최명길의 국서 찢고 통곡한 김상헌 / 521
관온인성황제에게 올리는 국서 / 543
의미없는 뇌물 / 546
자욱한 연기와 안개 / 562
치욕적인 왕의 눈물 / 573
오직 죽음뿐 / 582
혹한과 눈보라 / 586
약사발 / 606
무쇠로 만든 화살 / 610
눈물 / 613
세자와 세자빈 / 649
오달제와 윤집 / 660
망녕된 의논 / 664
윤집과 오달제의 하직 인사 / 674
미수에 그친 김상헌의 자결 / 677
삼전도 굴욕과 삼배고두례 / 700
47일만에 창경궁으로 / 703
주요 등장 인물 / 711
말고기와 황두 / 374
화호의 치욕 / 392
원망 / 418
고립 20일째 / 445
벌을 주면 해가 없고, 벌을 주지 않으면 해가 있는지 / 460
작은 돌, 큰 돌 / 476
1월 한겨울의 짙은 안개 / 487
폐단 / 491
온조왕 / 494
암퇘지 / 496
말꼴과 참살 / 499
햇무리 / 502
도정 / 504
호종관 / 505
전사자의 염빈 / 507
구원병 소식 / 509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양 / 511
최명길의 국서 찢고 통곡한 김상헌 / 521
관온인성황제에게 올리는 국서 / 543
의미없는 뇌물 / 546
자욱한 연기와 안개 / 562
치욕적인 왕의 눈물 / 573
오직 죽음뿐 / 582
혹한과 눈보라 / 586
약사발 / 606
무쇠로 만든 화살 / 610
눈물 / 613
세자와 세자빈 / 649
오달제와 윤집 / 660
망녕된 의논 / 664
윤집과 오달제의 하직 인사 / 674
미수에 그친 김상헌의 자결 / 677
삼전도 굴욕과 삼배고두례 / 700
47일만에 창경궁으로 / 703
주요 등장 인물 / 711
'35.조선시대사 이해 (독서) > 3.조선의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진왜란 (상)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2024 (0) | 2024.07.01 |
|---|---|
| 남한산성, 소현세자 죽음과 봉림대군의 즉위(2024) (0) | 2024.06.28 |
|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2019) (0) | 2024.02.05 |
| 정유재란사 (2018) - 한중일공동연구 (0) | 2023.04.20 |
| 임진왜란 (2023) (0)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