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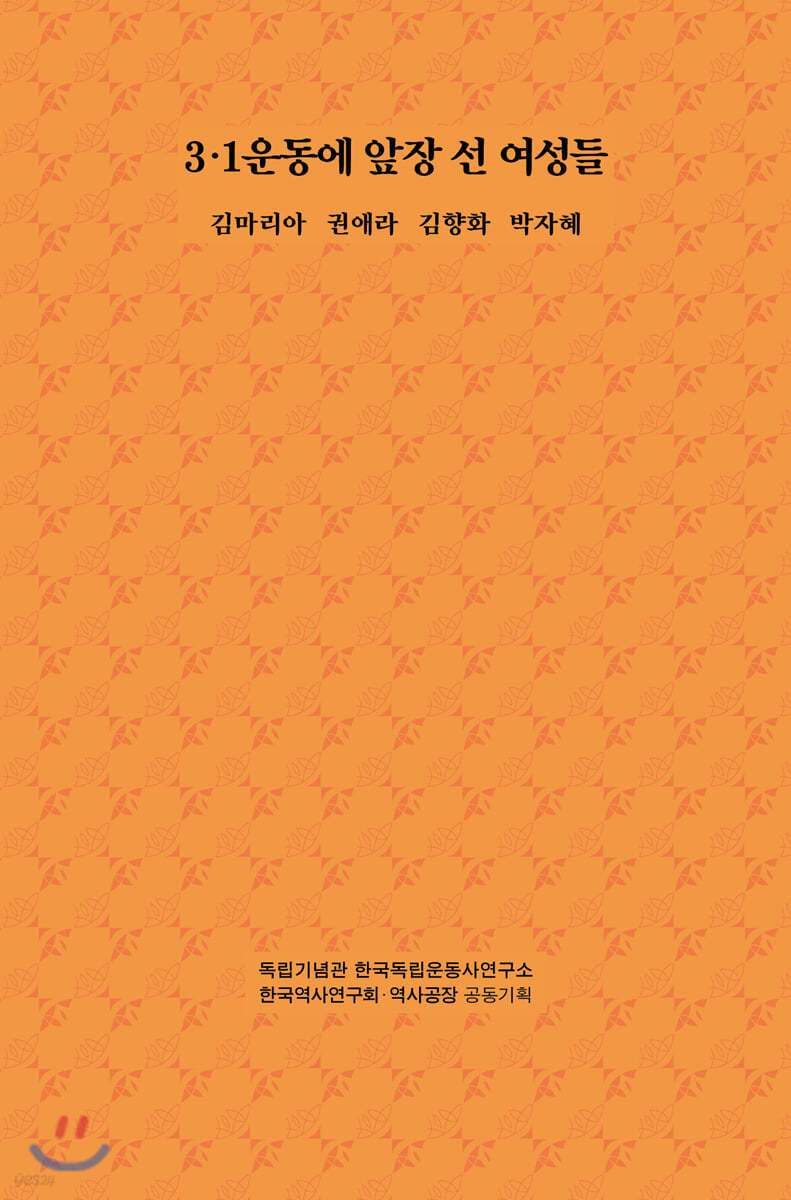
책소개
일제강점기, 물러서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향한 선택……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조명하다
이 책에 소개하는 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는 1919년 3월 1일 다른 공간,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3·1운동에 앞장섰다. 김마리아는 도쿄 유학 여학생으로서 2·8독립선언식에 참석한 후 국내로 들어와 여성들의 운동을 조직했다. 권애라는 유치원교사로서 개성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여학교를 거점으로 3·1운동을 주도했다. 김향화는 수원에서 기생을 창기와 동급으로 만든 일제에 저항하여 기생들의 3·1운동을 주도했다. 박자혜는 서울에서 조선총독부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간호사들이 3·1운동에 참여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립적으로 분연히 일어선 근대 여성들이었다. 독립운동은 식민지 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자신들이 사는 현실이 일제의 식민지인 것을 자각한 여성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곳에 독립운동이 있었다. 여성이 사회를 인식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1운동은 그러한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대거 등장한 사건이었다. 3·1운동의 현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불꽃같은 삶이 있었다. 이 책에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상상하며 시대와 함께했던 3·1운동의 여성 선배들을 만나길 바란다. 그들의 용기와 양심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삶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오롯이 전해지면 더 없이 기쁘겠다.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조명하다
이 책에 소개하는 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는 1919년 3월 1일 다른 공간,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3·1운동에 앞장섰다. 김마리아는 도쿄 유학 여학생으로서 2·8독립선언식에 참석한 후 국내로 들어와 여성들의 운동을 조직했다. 권애라는 유치원교사로서 개성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여학교를 거점으로 3·1운동을 주도했다. 김향화는 수원에서 기생을 창기와 동급으로 만든 일제에 저항하여 기생들의 3·1운동을 주도했다. 박자혜는 서울에서 조선총독부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간호사들이 3·1운동에 참여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자립적으로 분연히 일어선 근대 여성들이었다. 독립운동은 식민지 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자신들이 사는 현실이 일제의 식민지인 것을 자각한 여성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곳에 독립운동이 있었다. 여성이 사회를 인식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1운동은 그러한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대거 등장한 사건이었다. 3·1운동의 현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불꽃같은 삶이 있었다. 이 책에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상상하며 시대와 함께했던 3·1운동의 여성 선배들을 만나길 바란다. 그들의 용기와 양심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삶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오롯이 전해지면 더 없이 기쁘겠다.
목차
책머리에
여학생의 탄생 김마리아
기독교와 근대교육을 배경으로 성장하다
도쿄의 독립선언식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가하다
여성도 국민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다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다
배움의 열망으로 이역만리의 삶을 이겨내다
감시받는 삶이 끝나다
개성의 첫 시위를 이끌다 권애라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다
개성의 3·1운동을 촉발하다
여성해방과 여성교육을 웅변하다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
시대와 일제에 저항하다 고통을 겪다
해방 후 고단한 삶을 살며 잊혀가다
수원 기생 김향화와 3·1운동에 나선 기생들 김향화
김향화와 수원 기생들 만세운동에 나서다
기생들, 만세운동의 대열 속에 뛰어들다
기생들은 왜 만세운동을 했을까
기생들, 그들의 위치에서 저항하다
사회인·직업인으로서 박자혜의 삶과 민족운동 박자혜
간호부와 산파, 민족운동에 참여하다
궁녀가 되다
근대교육을 받다
간호사 겸 산파가 되다
3·1운동으로 변화하다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여학생의 탄생 김마리아
기독교와 근대교육을 배경으로 성장하다
도쿄의 독립선언식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가하다
여성도 국민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다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다
배움의 열망으로 이역만리의 삶을 이겨내다
감시받는 삶이 끝나다
개성의 첫 시위를 이끌다 권애라
근대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다
개성의 3·1운동을 촉발하다
여성해방과 여성교육을 웅변하다
국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
시대와 일제에 저항하다 고통을 겪다
해방 후 고단한 삶을 살며 잊혀가다
수원 기생 김향화와 3·1운동에 나선 기생들 김향화
김향화와 수원 기생들 만세운동에 나서다
기생들, 만세운동의 대열 속에 뛰어들다
기생들은 왜 만세운동을 했을까
기생들, 그들의 위치에서 저항하다
사회인·직업인으로서 박자혜의 삶과 민족운동 박자혜
간호부와 산파, 민족운동에 참여하다
궁녀가 되다
근대교육을 받다
간호사 겸 산파가 되다
3·1운동으로 변화하다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출판사 리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에 앞장섰던 4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오늘에 다시 만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와 한국역사연구회·역사공장이 함께 기획했다.
3·1운동을 전 민족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만드는 데에는 이들과 같은 여성들의 활동이 있었다. 독립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 보통 여성들이 현실을 마주하여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양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4명의 여성들은 보여주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민족과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기억하기 전에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독립운동은 식민지 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자신들이 사는 현실이 일제의 식민지인 것을 자각한 여성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곳에 독립운동이 있었다. 여성이 사회를 인식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1운동은 그러한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대거 등장한 사건이었다. 3·1운동의 현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불꽃같은 삶이 있었다.
3·1운동을 전 민족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 만드는 데에는 이들과 같은 여성들의 활동이 있었다. 독립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 보통 여성들이 현실을 마주하여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양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4명의 여성들은 보여주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민족과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기억하기 전에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독립운동은 식민지 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자신들이 사는 현실이 일제의 식민지인 것을 자각한 여성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곳에 독립운동이 있었다. 여성이 사회를 인식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1운동은 그러한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대거 등장한 사건이었다. 3·1운동의 현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들의 불꽃같은 삶이 있었다.
'18.역사이야기 (책소개) > 4.독립운동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덕신: 조선의 여성을 위해 의사가 된 독립운동가 (2023) (0) | 2024.06.04 |
|---|---|
| 한국 항일여성운동계의 대모 김마리아 (2013) (0) | 2024.06.04 |
| 항일무장투쟁과 여성독립운동가 (2020) - 윤희순 박차정 이화림 한국광복군 여성대원들 (0) | 2024.06.04 |
| [세트]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총100권) (0) | 2024.06.04 |
| 잊혀진 영웅들 (2017) - 독립운동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1)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