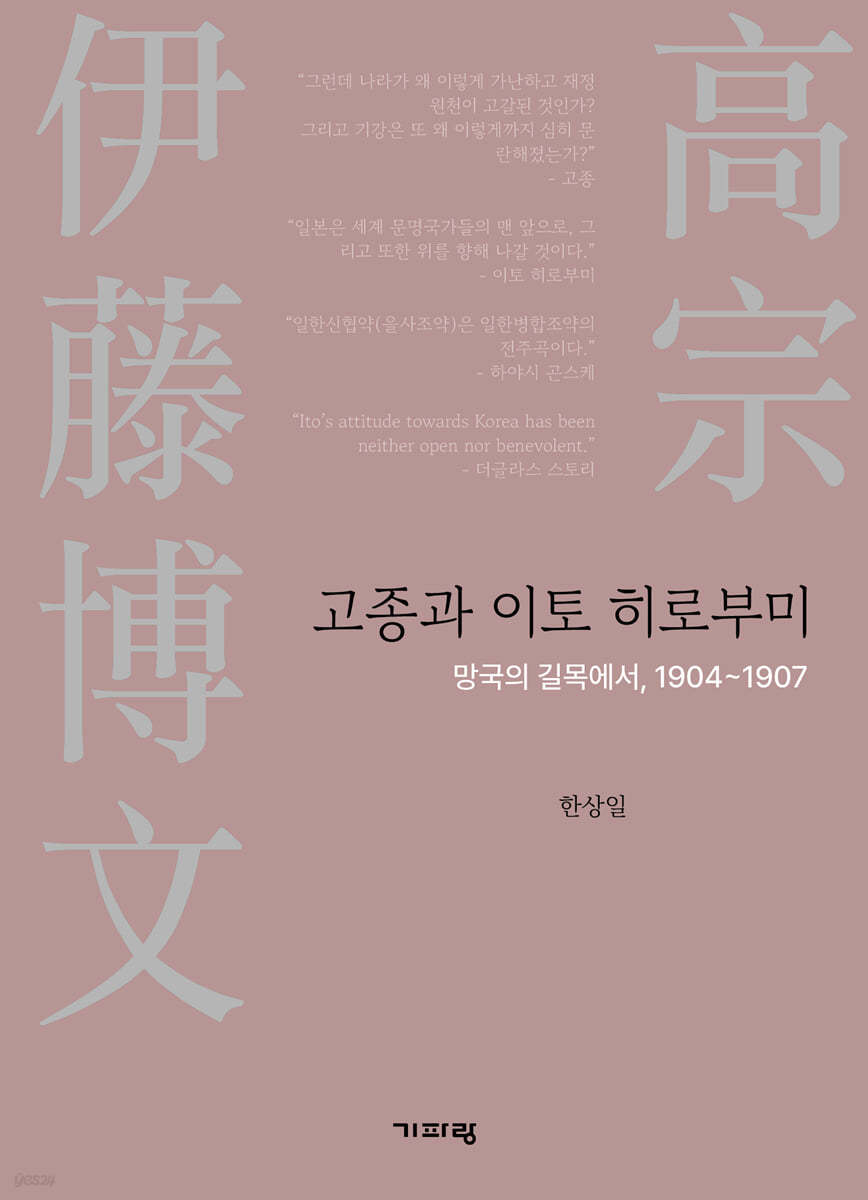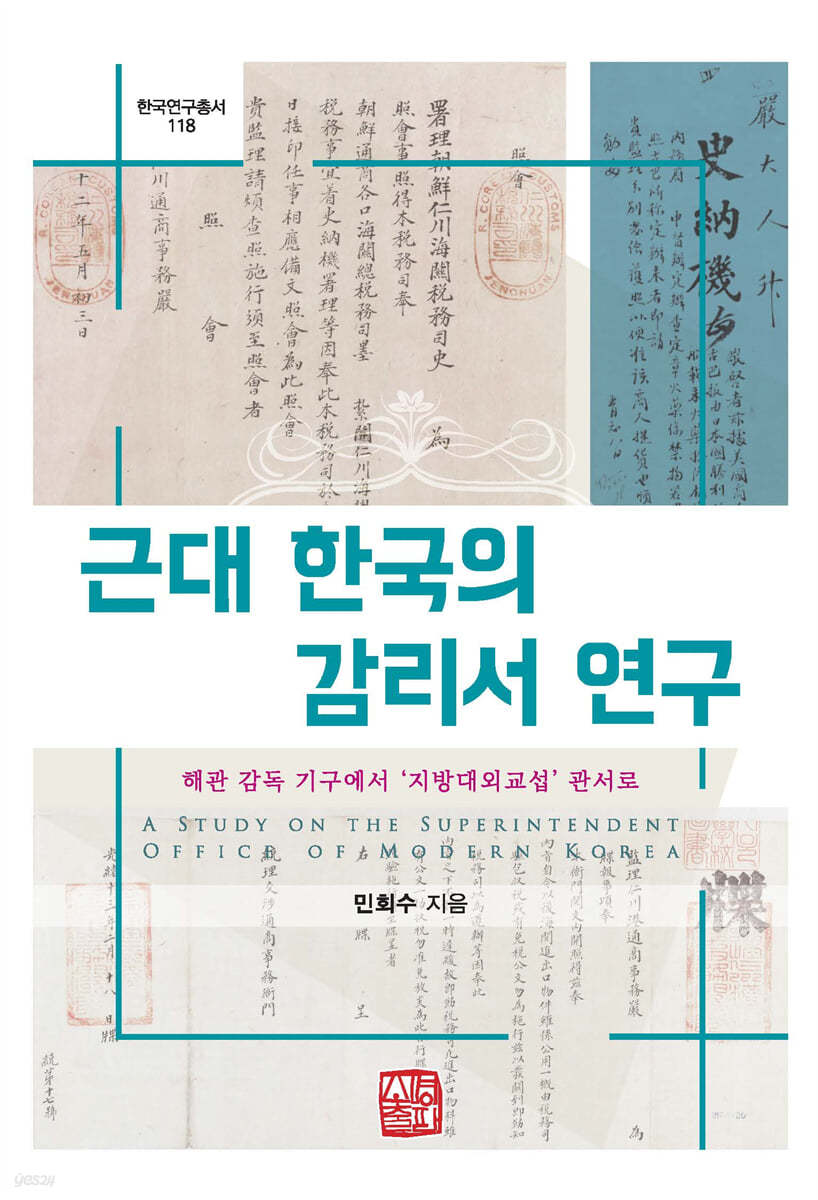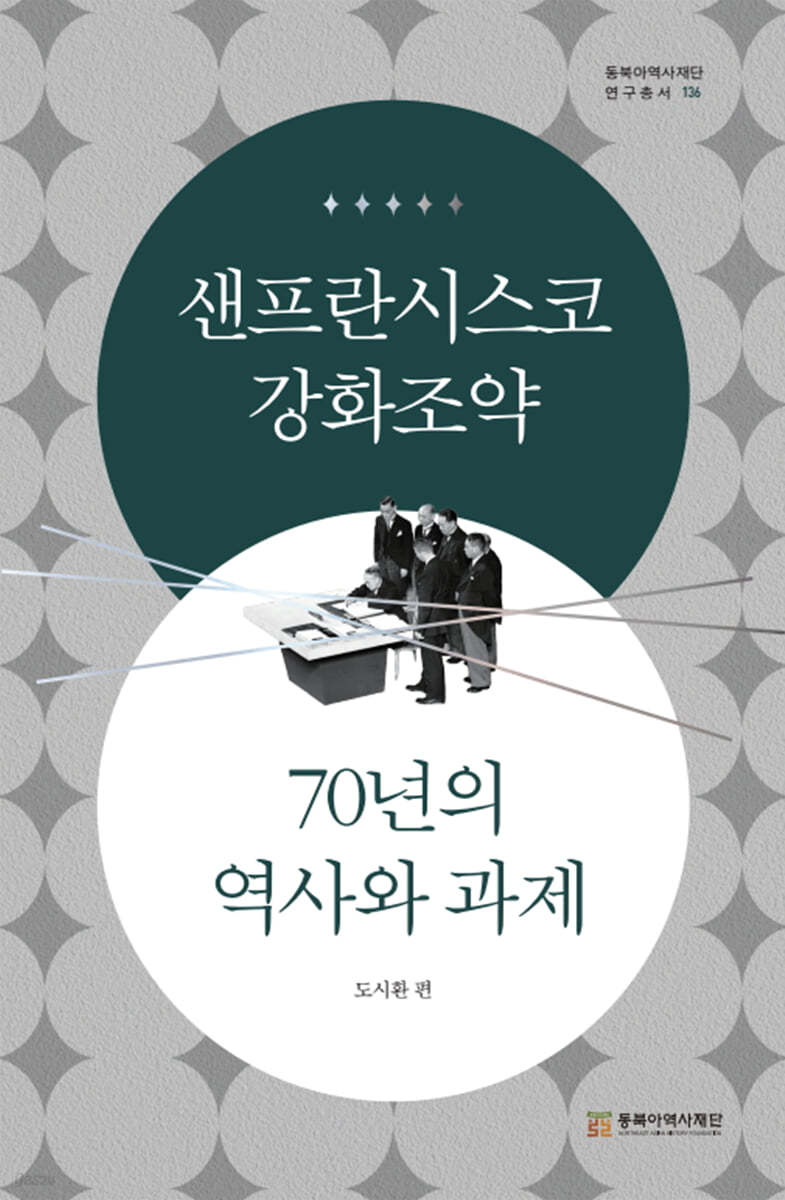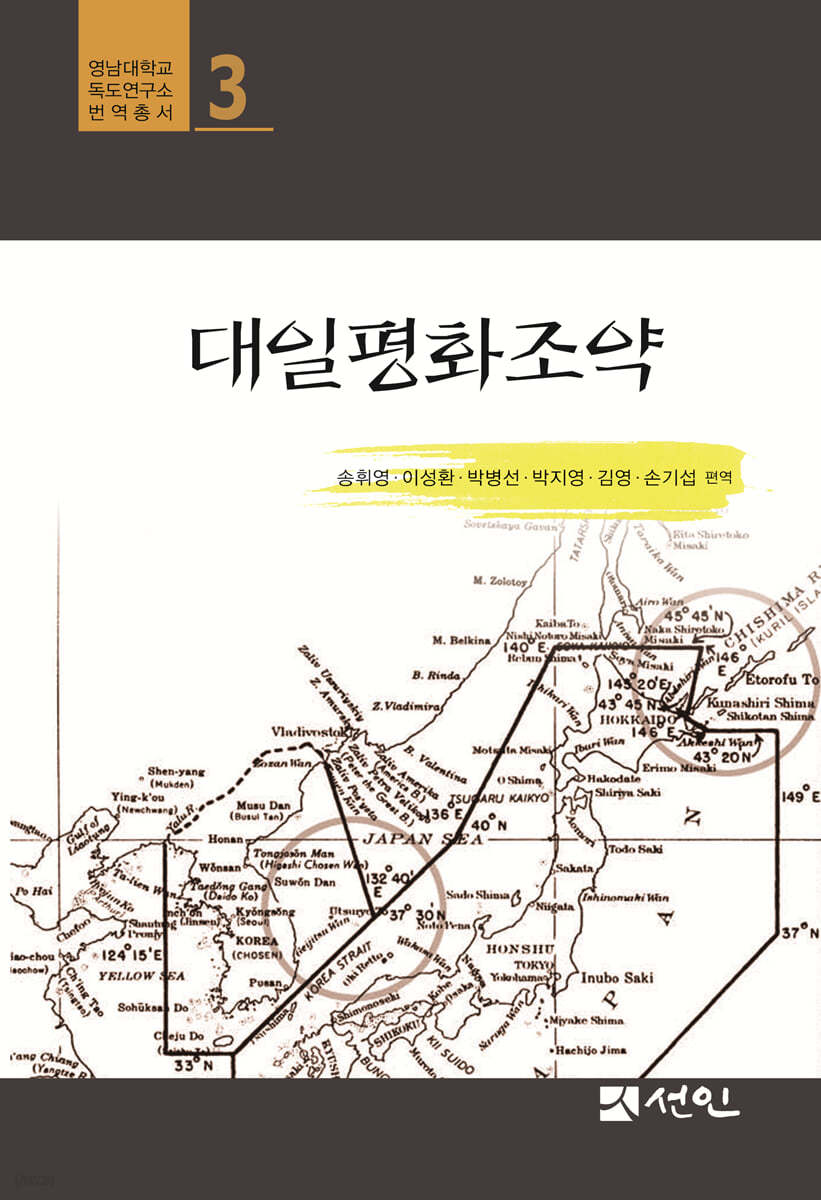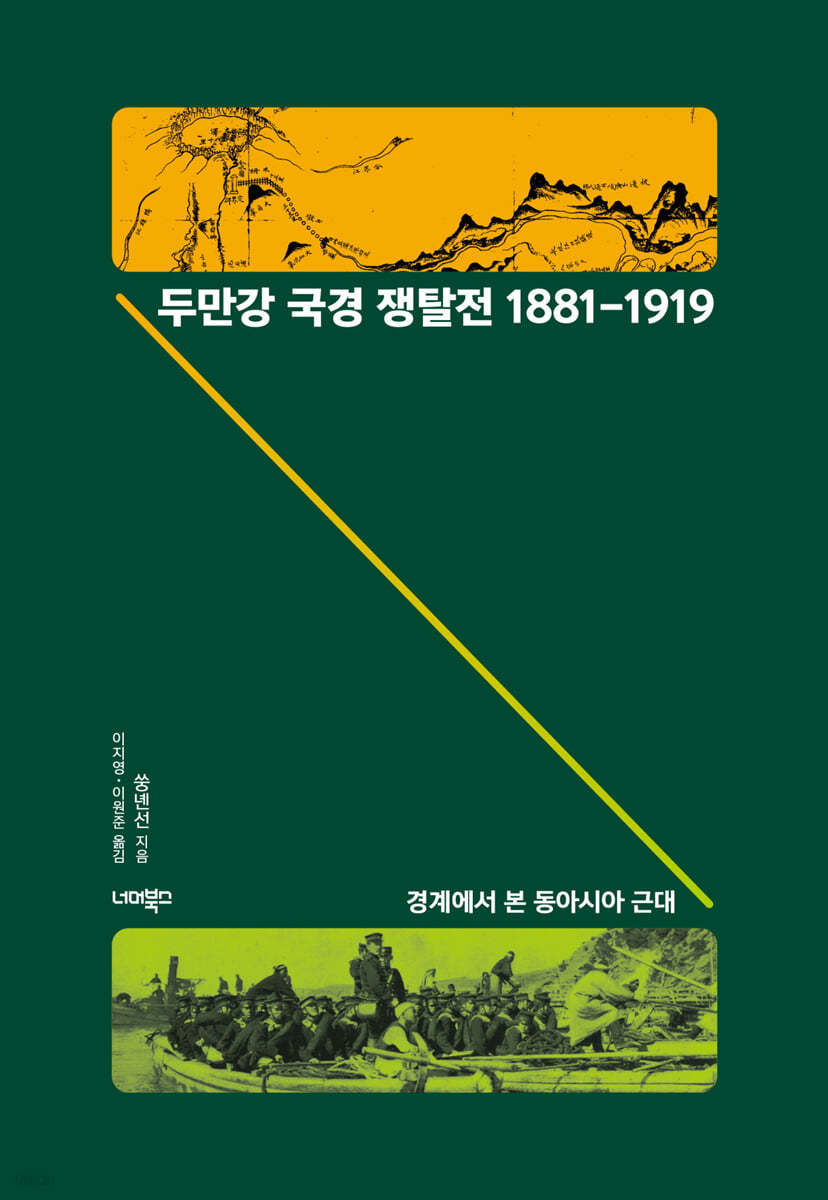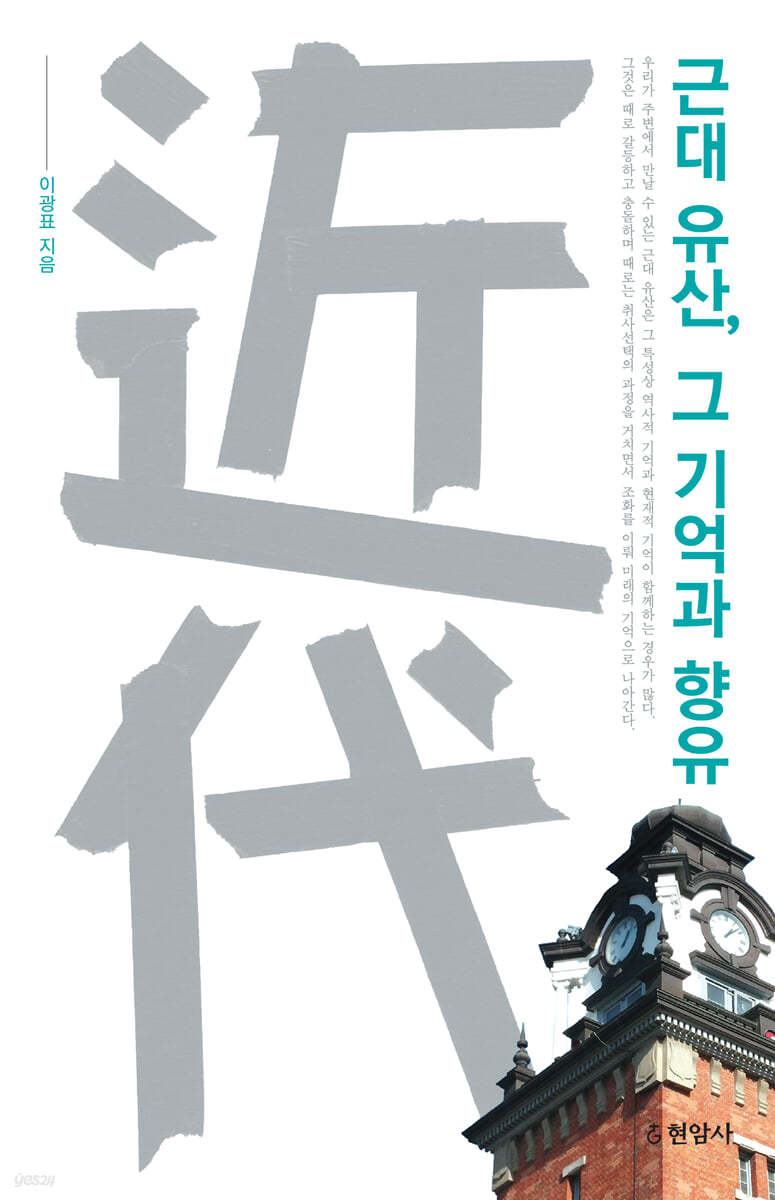책소개10여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엮은 일제 강점기 무관 15인의 약전45명의 대한제국 마지막 사관생도들과 두 스승 이갑과 노백린, 그리고 선배 김경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써 엮기 위해 작가는 10년 이상 자료를 수집했다. 얻은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모두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으며 저항과 굴종이라는 두 가지 길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친일과 굴종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광복 후 창군의 주도권을 잡은 역사의 모순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그래도 끝까지 절조를 지킨 지사들이 있어서 이 나라 현대사를 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삶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영욕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작가는 이 책에서 냉정하게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묻혀진 진실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