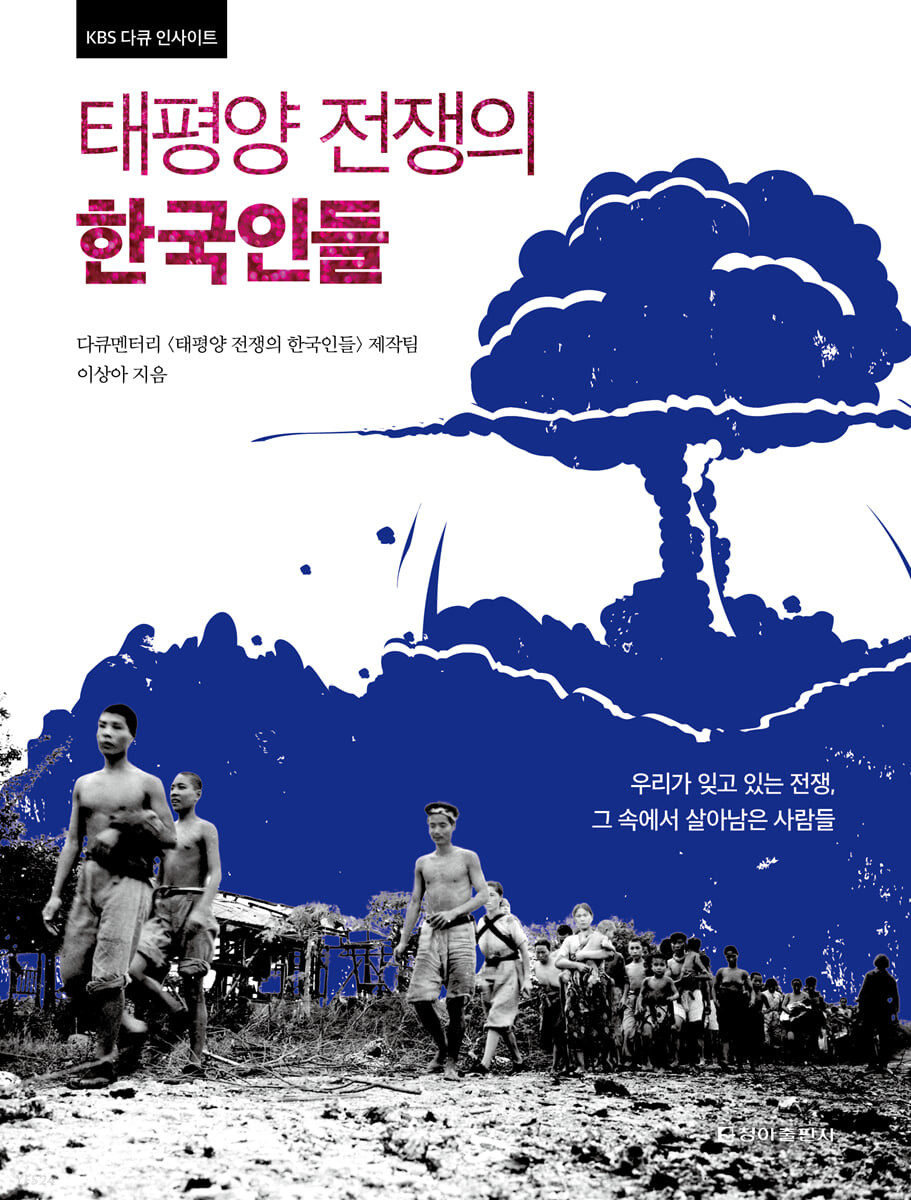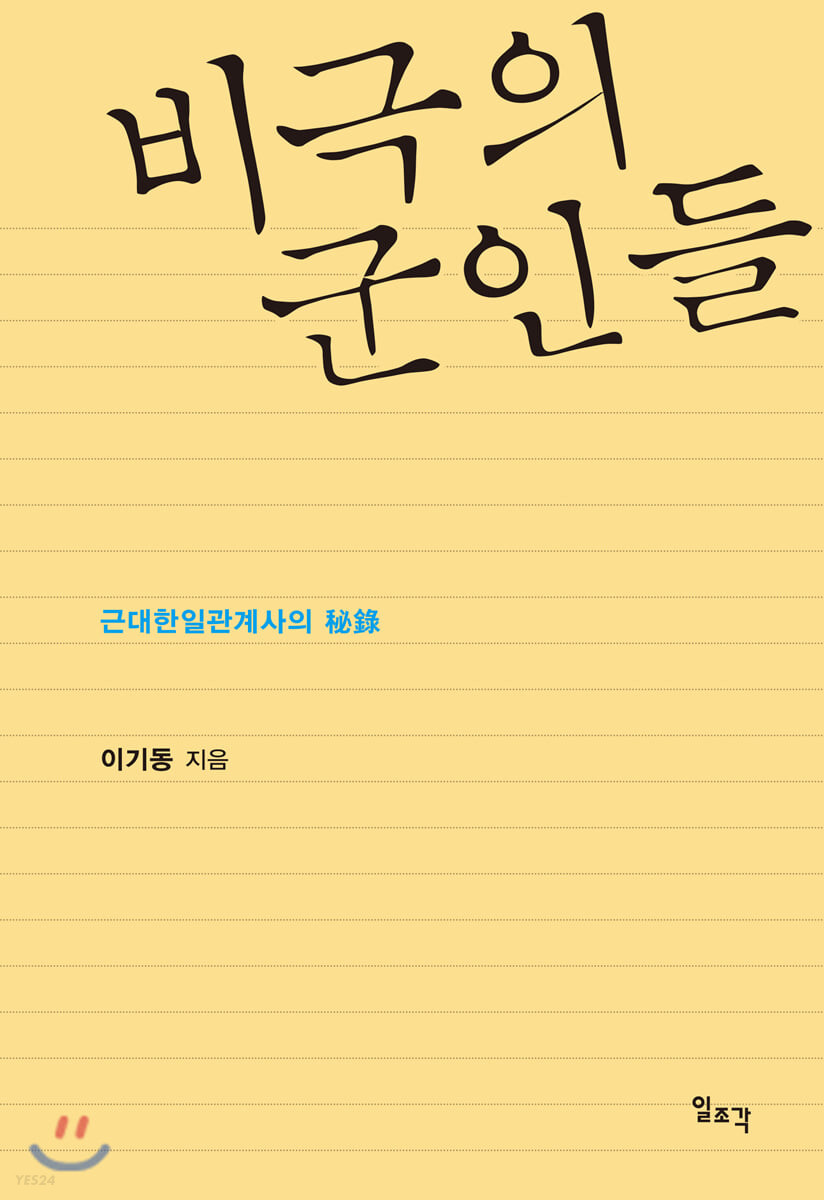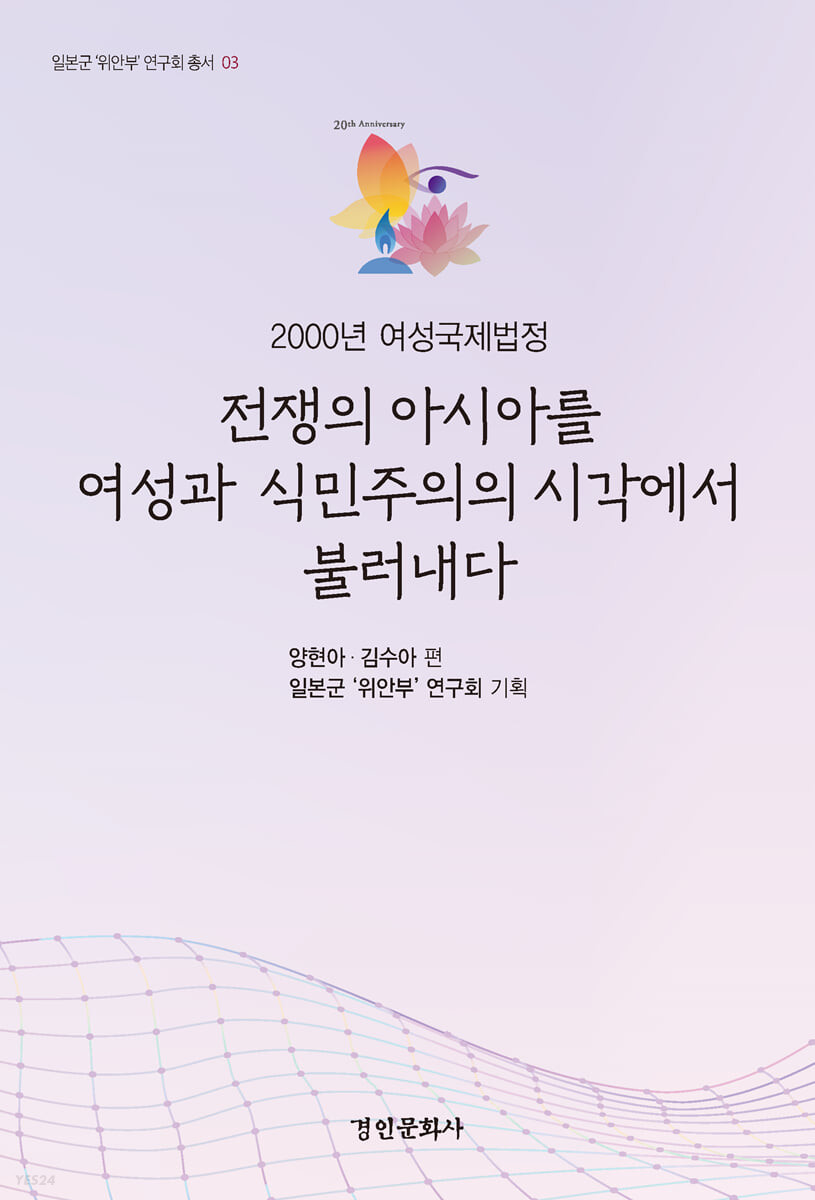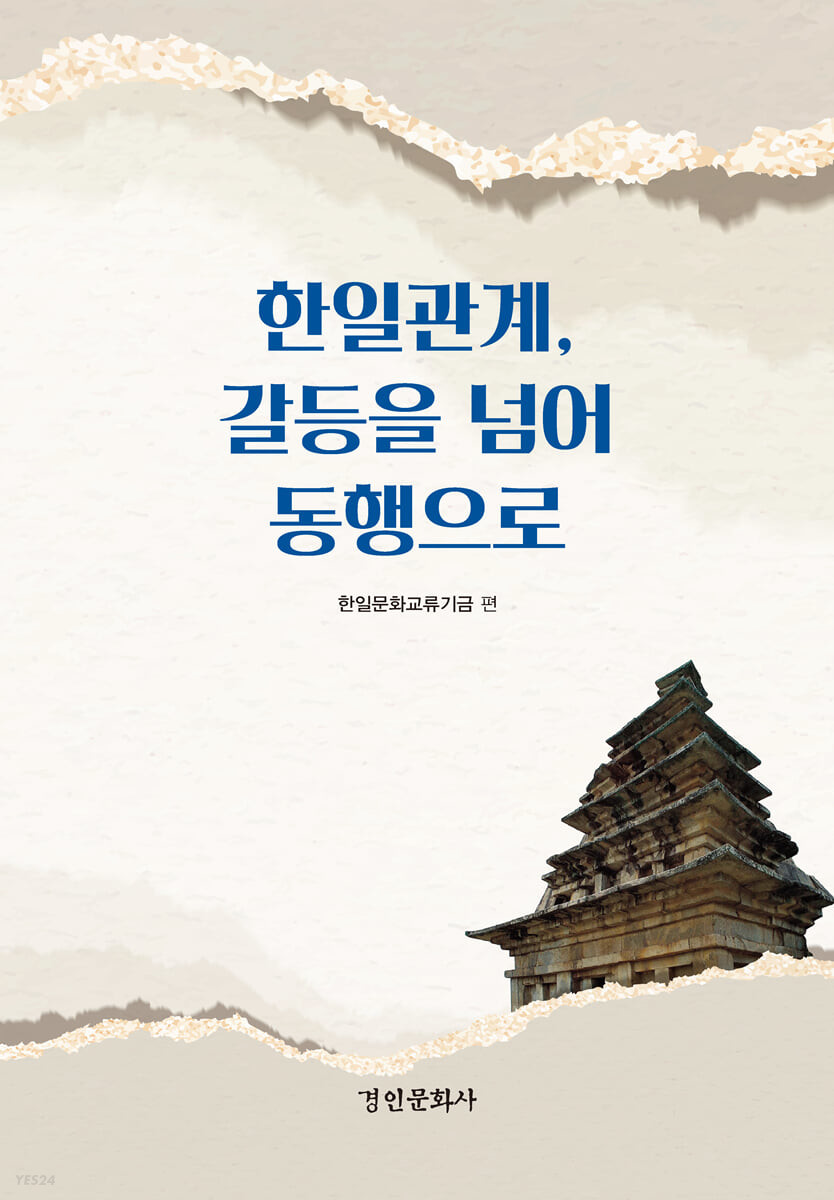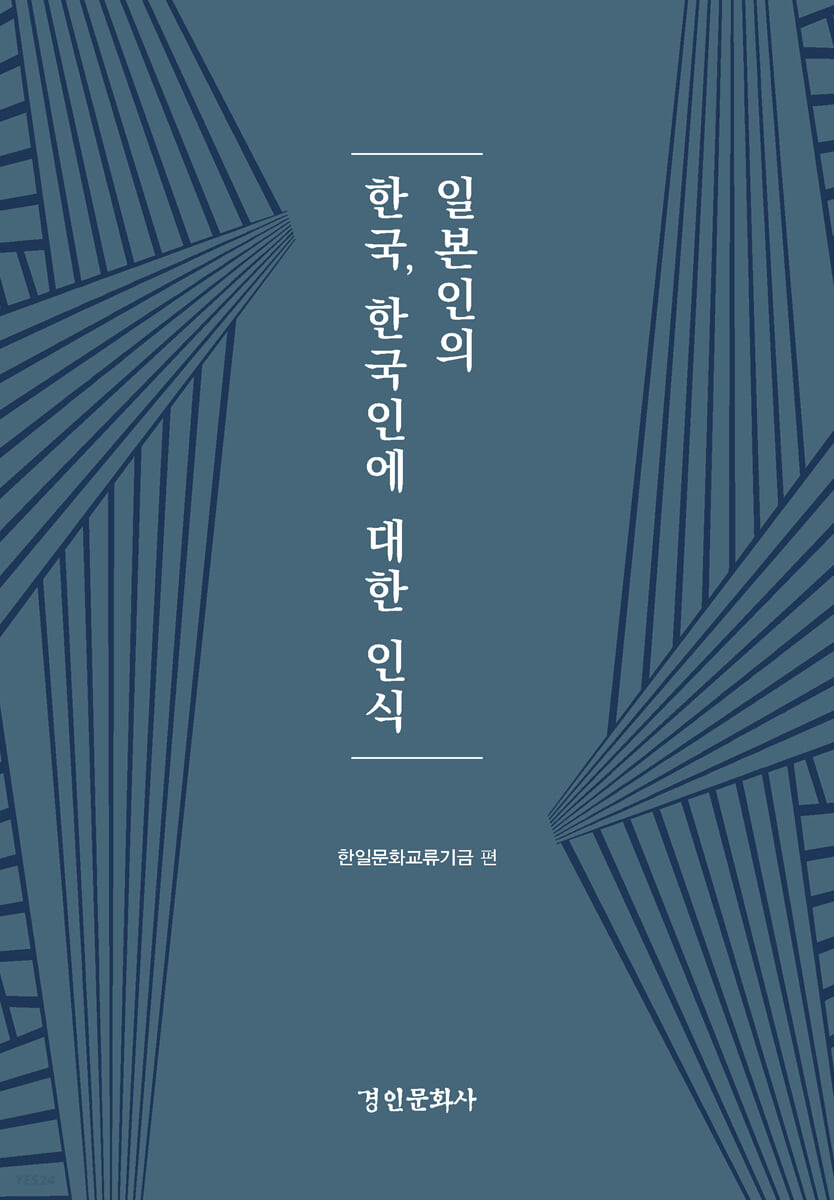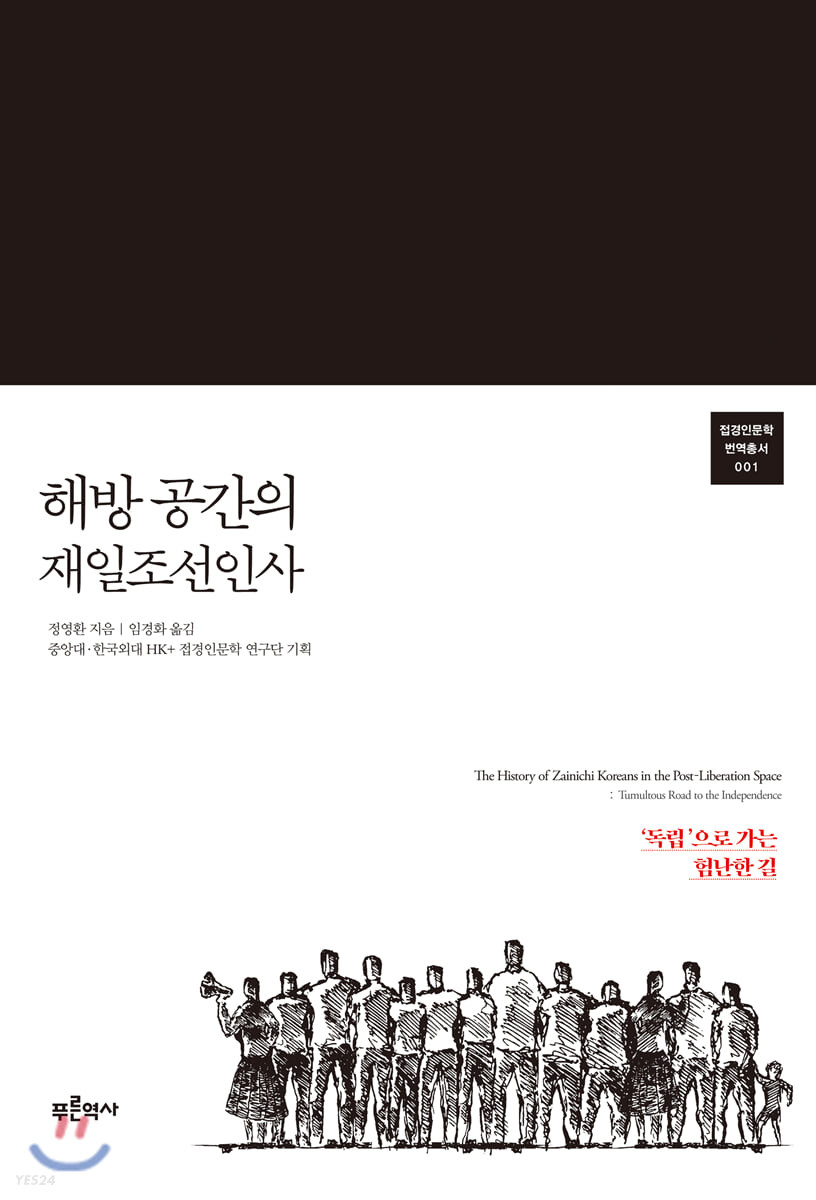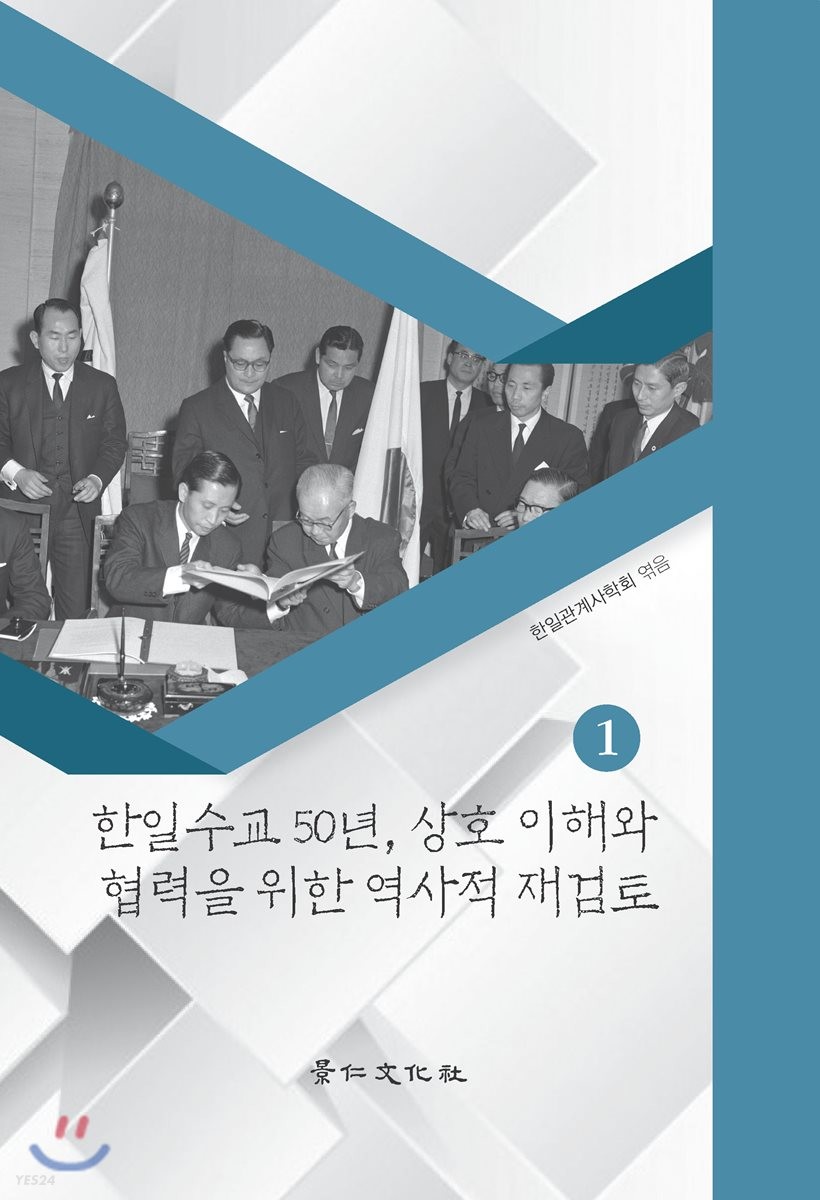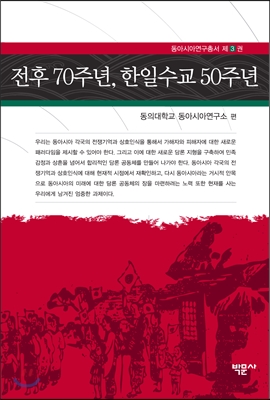책소개 일본 지성의 지혜와 성의 그리고 염원이 담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법 와다 하루키의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경위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면서생으로서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에서 해결을 위해 분투해온 지성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와다 선생의 경력과 신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러시아사 연구의 태두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현대사 연구의 대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선생의 이러한 주장과 연구 그리고 운동이 반영된 여러 저작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독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