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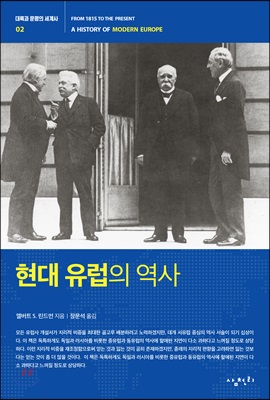
책소개
대륙과 문명의 세계사 2권. 현대 유럽의 파노라마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러시아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옛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역사에 할애된 지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하다.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대서양과 지중해, 스칸디나비아(북극해)라는 또렷한 경계를 지닌 유럽의 동쪽 경계를 흑해와 카스피 해, 캅카스산맥과 우랄산맥으로 정하고 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늘 변두리로 다뤄져 온 러시아와 동유럽이 유럽사의 주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주요한 변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유럽에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몇몇 흥미로운 단면들과도 마주치면서 독자들의 시야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유럽에 치우친 역사서술을 재조정하여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오늘날 유럽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개설서가 흔히 놓치는 주제와 쟁점, 평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특정 국가나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스크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시나 유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주민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등 민족국가의 변두리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늘 변두리로 다뤄져 온 러시아와 동유럽이 유럽사의 주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주요한 변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유럽에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몇몇 흥미로운 단면들과도 마주치면서 독자들의 시야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유럽에 치우친 역사서술을 재조정하여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오늘날 유럽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개설서가 흔히 놓치는 주제와 쟁점, 평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특정 국가나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스크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시나 유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주민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등 민족국가의 변두리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목차
머리말
서장 유럽이란 무엇인가
1부 낭만주의와 반란
1장 프랑스혁명의 유산
2장 빈회의와 포스트-나폴레옹 시대
3장 변화의 엔진
4장 이데올로기의 파종기
2부 자유주의, 민족주의, 진보
5장 자유주의 투쟁과 승리, 딜레마와 패배
6장 민족주의와 민족 통일
7장 19세기 중반의 안정화와 근대화
8장 낙관주의, 진보, 과학
3부 대불황에서 세계대전으로
9장 불황에 단련된 1870~1880년대
10장 벨 에포크, 독일과 러시아
11장 벨 에포크, 프랑스와 영국
12장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
4부 유럽 내전
13장 제1차 세계대전
14장 러시아혁명
15장 파리강화조약
16장 1920년대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들
17장 스탈린주의 러시아와 국제 공산주의
18장 파시즘과 나치즘의 발흥
19장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20장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5부 재건과 냉전 1943~1989년과 그 이후
21장 승전, 평화, 처벌
22장 독일 문제와 냉전의 기원
23장 혁명의 신비, 이데올로기와 현실
24장 제국주의의 종식과 유럽의 재건
25장 새로운 세대의 등장
26장 데탕트, 동방정책, 글라스노스트
결론 유럽의 미래, 남은 문제들
그림과 지도 목록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서장 유럽이란 무엇인가
1부 낭만주의와 반란
1장 프랑스혁명의 유산
2장 빈회의와 포스트-나폴레옹 시대
3장 변화의 엔진
4장 이데올로기의 파종기
2부 자유주의, 민족주의, 진보
5장 자유주의 투쟁과 승리, 딜레마와 패배
6장 민족주의와 민족 통일
7장 19세기 중반의 안정화와 근대화
8장 낙관주의, 진보, 과학
3부 대불황에서 세계대전으로
9장 불황에 단련된 1870~1880년대
10장 벨 에포크, 독일과 러시아
11장 벨 에포크, 프랑스와 영국
12장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
4부 유럽 내전
13장 제1차 세계대전
14장 러시아혁명
15장 파리강화조약
16장 1920년대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들
17장 스탈린주의 러시아와 국제 공산주의
18장 파시즘과 나치즘의 발흥
19장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20장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5부 재건과 냉전 1943~1989년과 그 이후
21장 승전, 평화, 처벌
22장 독일 문제와 냉전의 기원
23장 혁명의 신비, 이데올로기와 현실
24장 제국주의의 종식과 유럽의 재건
25장 새로운 세대의 등장
26장 데탕트, 동방정책, 글라스노스트
결론 유럽의 미래, 남은 문제들
그림과 지도 목록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출판사 리뷰
서유럽 중심의 역사서술을 뛰어넘는 현대 유럽의 파노라마
지금까지 ‘유럽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거의 모든 개설서는 지리적 비중을 최대한 안배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대개 서유럽 중심,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특정 국가들 중심의 역사 서술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 책은 러시아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옛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역사에 할애된 지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하다.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대서양과 지중해, 스칸디나비아(북극해)라는 또렷한 경계를 지닌 유럽의 동쪽 경계를 흑해와 카스피 해, 캅카스산맥과 우랄산맥으로 정하고 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늘 변두리로 다뤄져 온 러시아와 동유럽이 유럽사의 주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주요한 변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유럽에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몇몇 흥미로운 단면들과도 마주치면서 독자들의 시야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유럽에 치우친 역사서술을 재조정하여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오늘날 유럽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독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개설서가 흔히 놓치는 주제와 쟁점, 평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특정 국가나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스크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시나 유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주민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등 민족국가의 변두리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연대기적인 사실 나열을 뛰어넘는 ‘문제 중심’의 현대사
이 책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현대’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빈체제’가 수립된 1815년부터 유럽연합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아우르고 있다. 서양사에서 ‘현대사’는 일반적으로 20세기의 역사를 가리키며, 그 기점은 대개 제1차 세계대전, 빨라도 19세기 말 정도로 설정되곤 한다.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 초를 연속적으로 읽어 냄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어 온 오늘날 유럽의 평면적인 모습보다 분열과 통합, 혁명과 반동, 전쟁과 동맹을 거듭하면서 진화해 온 현대 유럽의 정체성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문제 중심’의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설서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지은이 앨버트 린드먼은 그런 ‘문제들’(Questions)을 설정하여 이 책의 결론 부분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 곧 독일 문제, 유대인 문제, 아일랜드 문제, 사회문제, 여성 문제, 동방문제 등 여섯 가지 ‘문제’를 통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19세기부터 유럽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20세기 후반까지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지구화, 환경, 인구, 제노포비아 같은 새로운 어젠다와 교차하며 유럽연합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중심’의 역사 서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개설서가 자칫 무미건조하고 고리타분해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
‘위로부터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균형감각
어찌 보면 ‘현대사’를 지배한 ‘여섯 가지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대사 ‘해석’인 셈이다. 린드먼은 머리말에서 자신이 ‘낡은’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화해시키고 종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여기서 ‘낡은’ 역사란 주로 엘리트가 중심인 위로부터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역사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힘이나 익명의 ‘대중들’이 중심인 ‘아래로부터의 역사’인 셈이다. 린드먼은 이 책 전반을 관통하며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려고 분투한다. ‘낡은’ 역사를 기각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역사학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런 균형감각과 신중함은 다양한 인간 군상과 객관적 힘들을 하나씩 심문해 가며 ‘역사’ 그 자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읽히게 한다.
유럽현대사를 통해 얻는 21세기 전망,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
이 책 머리말에서 결론까지, 심지어 옮긴이 후기에까지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다. 낡은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프랑스혁명과 강력한 반동,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며 유럽인들의 마음을 지배해 온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유럽의 미래와 남은 문제들, 특히 유럽연합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 책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다.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은 늘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 에스파냐 출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오늘도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라는 숙명에서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유럽 문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질적 부와 군사적 힘으로 상징되는 두려운 권력으로 성장했다. 음악과 미술, 문학이 그러했듯이, 유럽 문명이 보여 준 과학적 발견들은 유럽의 가장 단호한 적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이데올로기들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하지만 유럽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쇠퇴하여 충격적일 정도의 비합리성과 잔인함, 그리고 함께 유럽을 이루고 있던 동료 민족들에 대한 대량학살의 심연으로 추락했다.”(12쪽)
대륙과 문명의 세계사 (Wiley Blackwell Concise History of the Modern World)
오늘날 지구촌 여러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사 시리즈! 각 대륙과 문명에 대한 역사적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제시한다. 인종과 종교, 국민국가를 넘어 확장된 시공간의 지평에서 다양한 인류 문명의 특징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인구와 지형, 산업, 권력이 역동적으로 변모해 온 과정을 한눈에 보여 주는 지도와 생생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왕성한 연구 성과와 저작을 내고 있는 학계의 권위자들이 집필을 맡았
지금까지 ‘유럽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거의 모든 개설서는 지리적 비중을 최대한 안배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대개 서유럽 중심,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특정 국가들 중심의 역사 서술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 책은 러시아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옛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역사에 할애된 지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하다.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대서양과 지중해, 스칸디나비아(북극해)라는 또렷한 경계를 지닌 유럽의 동쪽 경계를 흑해와 카스피 해, 캅카스산맥과 우랄산맥으로 정하고 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늘 변두리로 다뤄져 온 러시아와 동유럽이 유럽사의 주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주요한 변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유럽에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몇몇 흥미로운 단면들과도 마주치면서 독자들의 시야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유럽에 치우친 역사서술을 재조정하여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오늘날 유럽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독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개설서가 흔히 놓치는 주제와 쟁점, 평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특정 국가나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스크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시나 유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주민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등 민족국가의 변두리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연대기적인 사실 나열을 뛰어넘는 ‘문제 중심’의 현대사
이 책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현대’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빈체제’가 수립된 1815년부터 유럽연합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아우르고 있다. 서양사에서 ‘현대사’는 일반적으로 20세기의 역사를 가리키며, 그 기점은 대개 제1차 세계대전, 빨라도 19세기 말 정도로 설정되곤 한다.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 초를 연속적으로 읽어 냄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어 온 오늘날 유럽의 평면적인 모습보다 분열과 통합, 혁명과 반동, 전쟁과 동맹을 거듭하면서 진화해 온 현대 유럽의 정체성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문제 중심’의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설서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지은이 앨버트 린드먼은 그런 ‘문제들’(Questions)을 설정하여 이 책의 결론 부분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 곧 독일 문제, 유대인 문제, 아일랜드 문제, 사회문제, 여성 문제, 동방문제 등 여섯 가지 ‘문제’를 통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19세기부터 유럽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20세기 후반까지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지구화, 환경, 인구, 제노포비아 같은 새로운 어젠다와 교차하며 유럽연합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중심’의 역사 서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개설서가 자칫 무미건조하고 고리타분해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
‘위로부터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균형감각
어찌 보면 ‘현대사’를 지배한 ‘여섯 가지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대사 ‘해석’인 셈이다. 린드먼은 머리말에서 자신이 ‘낡은’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화해시키고 종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여기서 ‘낡은’ 역사란 주로 엘리트가 중심인 위로부터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역사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힘이나 익명의 ‘대중들’이 중심인 ‘아래로부터의 역사’인 셈이다. 린드먼은 이 책 전반을 관통하며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려고 분투한다. ‘낡은’ 역사를 기각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역사학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런 균형감각과 신중함은 다양한 인간 군상과 객관적 힘들을 하나씩 심문해 가며 ‘역사’ 그 자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읽히게 한다.
유럽현대사를 통해 얻는 21세기 전망,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
이 책 머리말에서 결론까지, 심지어 옮긴이 후기에까지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다. 낡은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프랑스혁명과 강력한 반동,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며 유럽인들의 마음을 지배해 온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유럽의 미래와 남은 문제들, 특히 유럽연합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 책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다.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은 늘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 에스파냐 출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오늘도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라는 숙명에서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유럽 문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질적 부와 군사적 힘으로 상징되는 두려운 권력으로 성장했다. 음악과 미술, 문학이 그러했듯이, 유럽 문명이 보여 준 과학적 발견들은 유럽의 가장 단호한 적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이데올로기들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하지만 유럽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쇠퇴하여 충격적일 정도의 비합리성과 잔인함, 그리고 함께 유럽을 이루고 있던 동료 민족들에 대한 대량학살의 심연으로 추락했다.”(12쪽)
대륙과 문명의 세계사 (Wiley Blackwell Concise History of the Modern World)
오늘날 지구촌 여러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사 시리즈! 각 대륙과 문명에 대한 역사적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제시한다. 인종과 종교, 국민국가를 넘어 확장된 시공간의 지평에서 다양한 인류 문명의 특징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인구와 지형, 산업, 권력이 역동적으로 변모해 온 과정을 한눈에 보여 주는 지도와 생생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왕성한 연구 성과와 저작을 내고 있는 학계의 권위자들이 집필을 맡았
서유럽 중심의 역사서술을 뛰어넘는 현대 유럽의 파노라마
지금까지 ‘유럽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거의 모든 개설서는 지리적 비중을 최대한 안배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대개 서유럽 중심,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특정 국가들 중심의 역사 서술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 책은 러시아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옛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역사에 할애된 지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하다.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대서양과 지중해, 스칸디나비아(북극해)라는 또렷한 경계를 지닌 유럽의 동쪽 경계를 흑해와 카스피 해, 캅카스산맥과 우랄산맥으로 정하고 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늘 변두리로 다뤄져 온 러시아와 동유럽이 유럽사의 주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주요한 변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유럽에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몇몇 흥미로운 단면들과도 마주치면서 독자들의 시야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유럽에 치우친 역사서술을 재조정하여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오늘날 유럽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독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개설서가 흔히 놓치는 주제와 쟁점, 평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특정 국가나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스크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시나 유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주민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등 민족국가의 변두리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연대기적인 사실 나열을 뛰어넘는 ‘문제 중심’의 현대사
이 책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현대’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빈체제’가 수립된 1815년부터 유럽연합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아우르고 있다. 서양사에서 ‘현대사’는 일반적으로 20세기의 역사를 가리키며, 그 기점은 대개 제1차 세계대전, 빨라도 19세기 말 정도로 설정되곤 한다.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 초를 연속적으로 읽어 냄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어 온 오늘날 유럽의 평면적인 모습보다 분열과 통합, 혁명과 반동, 전쟁과 동맹을 거듭하면서 진화해 온 현대 유럽의 정체성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문제 중심’의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설서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지은이 앨버트 린드먼은 그런 ‘문제들’(Questions)을 설정하여 이 책의 결론 부분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 곧 독일 문제, 유대인 문제, 아일랜드 문제, 사회문제, 여성 문제, 동방문제 등 여섯 가지 ‘문제’를 통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19세기부터 유럽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20세기 후반까지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지구화, 환경, 인구, 제노포비아 같은 새로운 어젠다와 교차하며 유럽연합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중심’의 역사 서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개설서가 자칫 무미건조하고 고리타분해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
‘위로부터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균형감각
어찌 보면 ‘현대사’를 지배한 ‘여섯 가지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대사 ‘해석’인 셈이다. 린드먼은 머리말에서 자신이 ‘낡은’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화해시키고 종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여기서 ‘낡은’ 역사란 주로 엘리트가 중심인 위로부터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역사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힘이나 익명의 ‘대중들’이 중심인 ‘아래로부터의 역사’인 셈이다. 린드먼은 이 책 전반을 관통하며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려고 분투한다. ‘낡은’ 역사를 기각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역사학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런 균형감각과 신중함은 다양한 인간 군상과 객관적 힘들을 하나씩 심문해 가며 ‘역사’ 그 자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읽히게 한다.
유럽현대사를 통해 얻는 21세기 전망,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
이 책 머리말에서 결론까지, 심지어 옮긴이 후기에까지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다. 낡은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프랑스혁명과 강력한 반동,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며 유럽인들의 마음을 지배해 온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유럽의 미래와 남은 문제들, 특히 유럽연합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 책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다.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은 늘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 에스파냐 출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오늘도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라는 숙명에서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유럽 문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질적 부와 군사적 힘으로 상징되는 두려운 권력으로 성장했다. 음악과 미술, 문학이 그러했듯이, 유럽 문명이 보여 준 과학적 발견들은 유럽의 가장 단호한 적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이데올로기들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하지만 유럽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쇠퇴하여 충격적일 정도의 비합리성과 잔인함, 그리고 함께 유럽을 이루고 있던 동료 민족들에 대한 대량학살의 심연으로 추락했다.”(12쪽)
대륙과 문명의 세계사 (Wiley Blackwell Concise History of the Modern World)
오늘날 지구촌 여러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사 시리즈! 각 대륙과 문명에 대한 역사적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제시한다. 인종과 종교, 국민국가를 넘어 확장된 시공간의 지평에서 다양한 인류 문명의 특징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인구와 지형, 산업, 권력이 역동적으로 변모해 온 과정을 한눈에 보여 주는 지도와 생생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왕성한 연구 성과와 저작을 내고 있는 학계의 권위자들이 집필을 맡았다.
지금까지 ‘유럽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거의 모든 개설서는 지리적 비중을 최대한 안배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대개 서유럽 중심, 심지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특정 국가들 중심의 역사 서술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 책은 러시아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옛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역사에 할애된 지면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하다.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대서양과 지중해, 스칸디나비아(북극해)라는 또렷한 경계를 지닌 유럽의 동쪽 경계를 흑해와 카스피 해, 캅카스산맥과 우랄산맥으로 정하고 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늘 변두리로 다뤄져 온 러시아와 동유럽이 유럽사의 주류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주요한 변수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유럽에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역사가 보여 주는 몇몇 흥미로운 단면들과도 마주치면서 독자들의 시야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서유럽에 치우친 역사서술을 재조정하여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오늘날 유럽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독자들은 국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다채로운 전통과 문화를 세계사의 맥락에서 조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개설서가 흔히 놓치는 주제와 쟁점, 평가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특정 국가나 민족의 관점으로 이해하던 사건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읽어 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바스크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집시나 유대인,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주민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등 민족국가의 변두리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도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
연대기적인 사실 나열을 뛰어넘는 ‘문제 중심’의 현대사
이 책 《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현대’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빈체제’가 수립된 1815년부터 유럽연합이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아우르고 있다. 서양사에서 ‘현대사’는 일반적으로 20세기의 역사를 가리키며, 그 기점은 대개 제1차 세계대전, 빨라도 19세기 말 정도로 설정되곤 한다. 19세기와 20세기, 21세기 초를 연속적으로 읽어 냄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되어 온 오늘날 유럽의 평면적인 모습보다 분열과 통합, 혁명과 반동, 전쟁과 동맹을 거듭하면서 진화해 온 현대 유럽의 정체성을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문제 중심’의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설서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지은이 앨버트 린드먼은 그런 ‘문제들’(Questions)을 설정하여 이 책의 결론 부분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 곧 독일 문제, 유대인 문제, 아일랜드 문제, 사회문제, 여성 문제, 동방문제 등 여섯 가지 ‘문제’를 통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19세기부터 유럽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20세기 후반까지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는 지구화, 환경, 인구, 제노포비아 같은 새로운 어젠다와 교차하며 유럽연합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중심’의 역사 서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개설서가 자칫 무미건조하고 고리타분해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
‘위로부터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균형감각
어찌 보면 ‘현대사’를 지배한 ‘여섯 가지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현대사 ‘해석’인 셈이다. 린드먼은 머리말에서 자신이 ‘낡은’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화해시키고 종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다. 여기서 ‘낡은’ 역사란 주로 엘리트가 중심인 위로부터의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역사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힘이나 익명의 ‘대중들’이 중심인 ‘아래로부터의 역사’인 셈이다. 린드먼은 이 책 전반을 관통하며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려고 분투한다. ‘낡은’ 역사를 기각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역사학자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런 균형감각과 신중함은 다양한 인간 군상과 객관적 힘들을 하나씩 심문해 가며 ‘역사’ 그 자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읽히게 한다.
유럽현대사를 통해 얻는 21세기 전망,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
이 책 머리말에서 결론까지, 심지어 옮긴이 후기에까지 자주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는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다. 낡은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프랑스혁명과 강력한 반동,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지형을 바꾸며 유럽인들의 마음을 지배해 온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유럽의 미래와 남은 문제들, 특히 유럽연합의 딜레마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 책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다.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은 늘 역사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 에스파냐 출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오늘도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역사의 교훈’과 ‘과거 청산’이라는 숙명에서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유럽 문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질적 부와 군사적 힘으로 상징되는 두려운 권력으로 성장했다. 음악과 미술, 문학이 그러했듯이, 유럽 문명이 보여 준 과학적 발견들은 유럽의 가장 단호한 적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이데올로기들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 하지만 유럽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쇠퇴하여 충격적일 정도의 비합리성과 잔인함, 그리고 함께 유럽을 이루고 있던 동료 민족들에 대한 대량학살의 심연으로 추락했다.”(12쪽)
대륙과 문명의 세계사 (Wiley Blackwell Concise History of the Modern World)
오늘날 지구촌 여러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사 시리즈! 각 대륙과 문명에 대한 역사적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균형 잡힌 세계관을 제시한다. 인종과 종교, 국민국가를 넘어 확장된 시공간의 지평에서 다양한 인류 문명의 특징과 정체성을 파악한다. 인구와 지형, 산업, 권력이 역동적으로 변모해 온 과정을 한눈에 보여 주는 지도와 생생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왕성한 연구 성과와 저작을 내고 있는 학계의 권위자들이 집필을 맡았다.
'27.세계국가의 이해 (독서>책소개) > 9.유럽연합 EU'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럽의 죽음 (2020) - 다문화의 대륙인가? 사라지는 세계인가? (0) | 2023.01.21 |
|---|---|
| 현대 유럽의 이해 (2017 : William Outhwaite /김계동) (0) | 2023.01.21 |
| 유럽의 어제와 오늘 (2018) (0) | 2023.01.21 |
|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 (2019) (0) | 2023.01.21 |
| EU와 국경 (2022 김승민) (0) | 2023.01.14 |